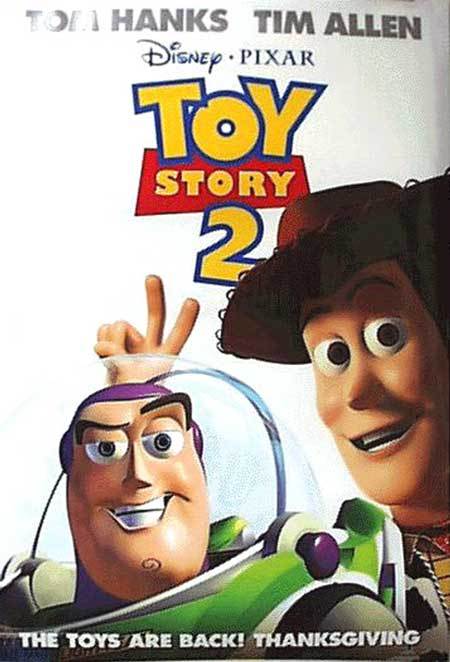|
|
감독 롤프 슈벨
원작 닉 바르코
출연 에리카 마로잔(일로나), 조아킴 크롤(자보), 벤 베커(한스), 스테파노 디오니시(안드라스) 외
참으로 매혹적이다. 일로나가 그렇고 ‘우울한 일요일’이라는 곡이 그렇듯 이 영화 역시 매혹적이다. 빨려들 듯한 그 매혹의 블랙홀에 휩싸인 느낌이다.
실로 예술이란 그 자체로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. 그것은 끊임없이 인간과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가 성장해 가는 생명이었다. 안드라스는 ‘우울한 일요일'(여기서는 그 녀석으로 지칭하겠다)을 작곡하였지만 그 녀석이 안드라스에게 던지는 화두는 그 녀석이 만들어낸 것이다. 그 감성의 단초는 안드라스에게서 출발하였겠지만 그것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의미로 인간에게 다가선다. 그 의미는 완성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무한의 진행형이며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진실을 드러낸다. 언제나 예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와 닿는 심상으로 우리 내면의 근원을 두드린다.
그 녀석이 던지는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녀석은 수많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는가. 안드라스는 그 답을 찾으려 부던히 노력한다. 자신의 창조물이 살인도구가 되는 것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녀석이 던져주는 심상을 더욱 침울한 언어로 덧입히려 하기도 한다. 그러나 결국 그 답은 안드라스의 삶 그 자체에 있었다.
일로나를 사이에 두고 미묘하지만 ‘줄앤짐’을 연상시키는 리버럴한 사랑의 황금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남자 자보가 일로나에게 매혹된 독일인 사업가 한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. ‘적자생존이란 동물 세계에나 적용되는 말이오. 인간 세상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나는 믿소.’ 그는 일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장사치로서 잇속에 매우 밝은 듯 하지만 일면 피고용자인 안드라스를 친구로서 대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동등한 처지임을 선뜻 인정하는 것으로 보면 보통 떠올리는 자본주의형 인간은 아닌 듯 하다. 그의 신념은 독일인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지점에서도 변하지 않는다.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, 도구 이상으로 보는 그의 인간됨은 안드라스가 구해내지 못했던 그 녀석의 화두를 어렴풋 잡아내는 데까지 이른다. ‘인간의 존엄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재겨 디딜 틈조차 없다고 느끼면, 정녕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필요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?’ 그 녀석은 침울한 어조로 이렇게 되뇌이고 있었던 것이다. 그리고 안드라스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의 미로를 헤매다가 막다른 길에 다달았음을 깨달을 때 미련 없이 그 녀석의 형체를 고스란히 자기 인생의 형체로 옮겨온 것이다.
결국은 그렇구나. 두 가지를 깨달았다. 음악 역시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나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었구나, 나는 얼마나 몰취향의 감성을 지녔길래 그 속삭임의 미동조차 느끼지 못하였을까. 수백의 영혼이 그 녀석과의 대화에서 죽음만이 그 시대의 최후의 출구임을 느꼈는데, 나는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영혼이란 말인가. 아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자라고 배워온 이 사회의 몰취향, 무감성을 탓할 것인가. 그러기에는 나의 나태함이 그 앞에서 버티고 있음을 느껴버린다. 하릴없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 나태한 동물.
그래도 나름으로는 영화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‘그 녀석’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호한 생각으로 자위한다. 적어도 나의 언어와 영화의 언어가 만나는 교집합의 공간은 음악의 그것보다는 더 클 것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.
그래서 과대해석을 하며 이 영화를 이렇게 이해해 버린다. 음악의 언어가 영화의 언어 속에서 유난히 빛을 발하는 영화, 그것이 시대와의 주고받음을 이루는 영화, 우울한 음악이 정신으로 승화되는 영화.
 |